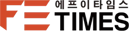[팸타임스 이경한 기자 ] 물고기는 측선을 사용하여 먹이나 동족, 그리고 포식자의 움직임에 따라 달라지는 물의 흐름을 감지한다.
측선은 어류의 몸 양쪽에 머리에서 꼬리부에 이르기까지 선상으로 배열되어 있는 기계적 감각기로 물체나 다른 생물을 감지하거나, 수류의 변화를 감수하는 촉각기관이다.
물고기는 측선에 있는 매우 작은 크기의 감각기관을 이용하여 정확히 길을 찾는다. 그러나 물의 유속이 빨라지면 잡음 또한 증가한다.
본 대학교의 과학자들은 처음을 실제 물고기와 닮은 3차원 모델을 만들어 냈으며 실제 물이 흐를 때의 조건들을 정확히 구현해냈다.
이를 이용한 실험 환경에서 측정된 수치는 물고기의 특정 해부학적인 적응이 잡음을 최소화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실험 결과는 학술지 'The Journal of the Royal Society Interface'에 게재되었다.
버들치는 천천히 흐르는 강 아래쪽에 서식하는 물고기인데. 버들치는 대부분의 물고기와 마찬가지로 측선을 사용하여 물의 흐름을 감지한다.
이 기관의 기계적 감각수용기는 몸체 표면 전체에 고루 분포하고 있고, 이러한 특성이 바로 물고기가 물의 3차원적 유체역학 이미지를 구축할 수 있는 이유이다. 물고기는 이러한 특징을 이용하여 어두운 곳에서도 길을 찾고 먹이와 동족, 또는 포식자들을 식별한다.
본 대학교에서 최근 은퇴한 동물학 교수인 호스트 블렉만은 물고기의 측선을 연구하는데 몇 년이라는 시간을 보냈고 이를 통해 밝혀낸 결과를 활용했다.
활용 분야는 배관이 새는 부분들을 파악하는데 이용할 수 있도록 유체의 흐름을 기술적으로 파악하는 센서에 대한 아이디어를 고안해 최초의 현실적인 3차원 컴퓨터 모델이 탄생한다.
헨드릭 허조그 박사와 알렉산더 지글러 박사, 이렇게 두 명의 과학자들은 물고기의 측선에 대한 연구를 새로운 차원으로 끌어올렸다.
이들은 최초로 물고기 측선의 현실적인 3D 컴퓨터 모델을 구축하였으며, 이를 이용해 센서 주변에 흐르는 유속의 상태를 정밀하게 분석했다.
허조그 박사는 버들치의 머리가 측선 감각기관이 유난히 복잡한 형태를 띄는 곳이라 버들치의 머리 부분의 측선을 연구하는 데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고 밝혔다.
물고기의 측선에는 두 가지 종류의 감각기관이 있는데, 이들 중 일부는 조그만 혹처럼 피부에서 튀어나온 부분도 있다. 나머지 감각기관은 머리뼈를 따라 움푹 파여있는 곳에 위치하며 작은 크기의 모공으로 물고기의 몸체 바깥을 흐르는 물과 접했다.
민물 새우와 같은 먹이가 물고기의 근처에 있을 경우 근처의 수류와 수압이 변화하고 물고기는 측선의 수 많은 감각기관을 통해 이를 감지한다. 하지만 이렇게 달라지는 수류를 감지하는 측선의 실제 기능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명료하게 정립된 연구결과가 존재하지 않았다.
두 박사가 개발한 3차원 모델은 웨스트팔리안 대학의 응용과학과 소속 버짓 클라인으로부터 지지를 받았다.
클라인은 동물학에서의 자신의 학사논문에서 3D 재구조화의 다양한 방법들에 대해 비교했다.
그는 버들치의 머리를 다양한 각도에서 찍어 남긴 350장의 사진으로 버들치의 모습을 3D 형상화한 모델을 만들었다. 감각기관이 나있는 홈이나 측선의 감각기관들은 그 구조를 명확히 나타내기 위해 다른 색상으로 표시됐다.
클라인은 이후 훨씬 더 고해상도인 레이저 스캐닝 절차를 사용하여 버들치를 디지털화하는 방법으로 데이터 세트를 최적화시켰다.
이러한 방법으로 실제와 같은 버들치의 모습이 탄생할 수 있었지만, 버들치의 내부 모습은 다른 방법으로 구축됐다.
버들치의 피부 밑 구조는 마이크로 CT 촬영 기법으로 구축될 수 있었는데, 이러한 방법들을 종합적으로 사용하여 실제와 흡사한 삼차원 측선 모델이 만들어질 수 있었다.
이러한 실제와 똑같은 모델을 이용하여 수류의 다양한 조건들을 시뮬레이션 상에서 구축할 수 있었으며, 여러가지 센서를 통해 감지한 유체역학적 신호들을 산출해낼 수 있었다.
물의 유속이 빨라지면 물고기의 측선에 잡히는 잡음 신호 또한 커지게 된다. 이러한 조건에도 불구하고 물고기는 빠른 유속에서도 주변 환경을 정확히 인지하는데, 이는 3차원 모델을 이용한 수치 산출 결과 피부 위로 볼록 솟아오른 혹과 같은 감각기관에서 유속이 상당히 느려지기 때문이라는 사실이 밝혀졌다.
허조그 박사는 이러한 이유로 물고기가 빠르게 흐르는 물 속에 있더라도 잡음 보다는 먹이와 같은 주변 환경 요소들에서 오는 신호가 감각기관에 더 크게 감지된다고 밝혔다.
머리뼈를 따라 나있는 홈에 위치한 감각기관들은 감각기관들이 위치한 홈의 직경이 각기 달라서 각 감각기관이 가장 민감하게 감지할 수 있는 유속이 제각기 다르다.
이를 응용하면 수중 로봇의 길을 찾는 기능이 크게 향상될 수 있다.
지글러 박사는 "이러한 체계적인 접근 방식을 사용하면 미래에는 매우 높은 수준에서 여러 종류의 물고기들의 비교 해부학적 연구가 가능해질 것이다"라고 말했다.
허조그 박사는 버들치의 감각기관에서 영감을 얻은 응용 기술들을 사용하면 수중 로봇이 유속 센서를 사용하여 물 속에서 자체적으로 길을 찾아가는 능력이 상당히 높은 수준까지 개선되는 것도 가능하다고 밝혔다.
이경한 기자 fam1@pcss.co.kr
교육 뉴스
-
![홈스쿨링 급증, "장점 많지만 단점도 생각해야"]()
홈스쿨링 급증, "장점 많지만 단점도 생각해야"
-
![유전부터 영화까지…자녀의 창의성 길러주기]()
유전부터 영화까지…자녀의 창의성 길러주기
-
![소통하고 사랑하라…커뮤니케이션과 공감 통한 자녀 교육 중요하다]()
소통하고 사랑하라…커뮤니케이션과 공감 통한 자녀 교육 중요하다
-
![자녀 방과 후 수업, 부모-자녀에게 모두 유익하려면]()
자녀 방과 후 수업, 부모-자녀에게 모두 유익하려면
-
![말썽부린 자녀의 올바른 훈육, 어디서부터 시작할까?]()
말썽부린 자녀의 올바른 훈육, 어디서부터 시작할까?
-
![핀잔 없는 자녀 훈육법…긍정적인 질문이 답]()
핀잔 없는 자녀 훈육법…긍정적인 질문이 답
-
![어린 자녀의 공격적 행동에 대처할 수 있는 부모의 관리 방안]()
어린 자녀의 공격적 행동에 대처할 수 있는 부모의 관리 방안
-
![아이 시공간 인식 능력 키운다…'비디오 게임' 장점 과학전 근거 나와]()
아이 시공간 인식 능력 키운다…'비디오 게임' 장점 과학전 근거 나와
-
![공격성 드러내는 자녀의 '외현적 문제행동', 어떻게 다루나]()
공격성 드러내는 자녀의 '외현적 문제행동', 어떻게 다루나
-
![자녀가 일으키는 행동 문제, 어떻게 대처하는 것이 좋을까?]()
자녀가 일으키는 행동 문제, 어떻게 대처하는 것이 좋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