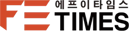[팸타임스 강규정 기자] 시조새는 9세기에 독일에서 발견됐다. 발견 당시 이빨이 있고깃털이 달린 동물의 화석으로, 생명의 역사에서 가장 큰 전환점 중 하나다.
공룡이 하늘을 날기 시작했고, 이로 인해 조류가 탄생했다. 시조새만큼 진화 역사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동물고래는 거대한 수중 포유류로 크릴새우를 주로 잡아 먹는다.
뉴욕 기술 연구소의 조나단 가이슬러와 그의 동료들은 이 시조새 화석의 주목할만한 점을 밝히고 이것이 고래와 새들에게 어떤 역할을 했는지 알려준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수염고래는 기술적으로 엄청난 양의 물을 흡입한 뒤 작은 동물만 먹이로 걸러서 섭취하고 물은 다시 뱉어낸다. 이 때 사용되는 것이 수염판인데 이것은 다른 포유류들의 이빨이 자라는 위치에 있으며 작은 동물을 거르는 필터 역할을 한다.
이 수염판은 치아의 주성분인 튼튼한 상아질이 아니라 모발과 손톱을 구성하는 유연한 물질인 각질로 구성됐다.
일부 연구자들은 고래가 이 흡입 필터를 이용해 먹이를 먹기 시작한 이유는 치아가 굳어 이 수염판으로 대체되었기 때문이라고 이론을 세웠다.
다른 연구진은 고대 고래들이 흡입 방식으로 먹이를 먹으면서 치아가 완전히 사라졌다고 말했다.
흡입 방식으로 먹이를 먹으면 치아가 더 이상 필요 없기 때문이다. 이런 방식은 예를 들어 닭과 같은 일부 동물에게서도 발견되며 흡입 섭취를 더욱 효율적으로 만들었다.
그러나 이런 수염판은 화석 기록에서는 거의 발견되지 않는다. 따라서 아직 어떤 이론이 정확한지는 밝혀지지 않았다.
코로노돈 하벤스테이니라는 이름의 새로운 화석은 사우스 캐롤라이나의 완도 강 근처에있는 2800만 년 된 퇴적물에서 발견됐으며, 넓은 주둥이와 짧은 턱뼈와 같은 특징때문에 수염고래의 일종으로 분류됐다.
그러나 현존하는 수염고래와 달리, 이 화석은 이빨을 가지고 있었다. 그다지 날카롭지는 않았다. 이 이빨은 뾰족한 부분의 각도가 155도였다.
오징어를 잡아먹는 향유고래의 이빨 끝이 50~60도인 것과 비교하면 무딘 모양이다. 또 씹는 활동을 하는 다른 동물과 비교해서 뼈에 단단히 지지되는 이빨도 아니었다.
그러나 가이슬러 박사와 그의 동료가 화석의 위턱과 아래턱에서 치아를 가져와 분석해보니, 이빨은 작은 동물을 물에서 걸러내는 체와 같은 역할을 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즉, 고래가 이빨이 있을 때부터 흡입 및 필터링 방식으로 먹이를 먹도록 진화했다는 이론에 힘을 실어주는 결과다. 하지만 가이슬러 박사는 이빨이 한데 모여 체를 형성할 수 있는 것은 맞지만 이 동물이 실제로 그런 방식을 사용했는지는 정확하지 않다고 말했다.
가이슬러 박사는 화석을 동료인 브라이언 베아티에게 가져가 자세히 분석했으며, 베아티 박사는 이 동물이 살아 있을 때 작은 먹이를 물에서 걸러내 먹었다면 입 부근에 있는 치아가 체와 같은 역할을 했을 것이라고 이론화했다. 즉 고대 고래는 물에서 작은 먹이를 걸러 먹었다.
그러나 이빨이 있는 고래는 기회가 주어지면 개별적인 큰 먹이를 잡아먹을 수도 있다. 현대 고래가 그런 행동을 하는지는 알려져있지 않다. 그러나 표범물개를 보면 알 수 있다.
표범물개는 크릴새우를 걸러내 먹기도 하고 이빨로 펭귄을 잡아먹기도 한다. 표범물개는 코로노돈 하벤스테이니와 비슷한 주둥이와 턱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새로운 화석은 전 세계에서 가장 큰 동물인 고래가 어떻게 포식자에서 먹이를 걸러 먹는 동물로 변했는지 그 경로에 중요한 이정표를 남겼다.
강규정 기자 fam7@pcss.co.kr
교육 뉴스
-
![홈스쿨링 급증, "장점 많지만 단점도 생각해야"]()
홈스쿨링 급증, "장점 많지만 단점도 생각해야"
-
![유전부터 영화까지…자녀의 창의성 길러주기]()
유전부터 영화까지…자녀의 창의성 길러주기
-
![소통하고 사랑하라…커뮤니케이션과 공감 통한 자녀 교육 중요하다]()
소통하고 사랑하라…커뮤니케이션과 공감 통한 자녀 교육 중요하다
-
![자녀 방과 후 수업, 부모-자녀에게 모두 유익하려면]()
자녀 방과 후 수업, 부모-자녀에게 모두 유익하려면
-
![말썽부린 자녀의 올바른 훈육, 어디서부터 시작할까?]()
말썽부린 자녀의 올바른 훈육, 어디서부터 시작할까?
-
![핀잔 없는 자녀 훈육법…긍정적인 질문이 답]()
핀잔 없는 자녀 훈육법…긍정적인 질문이 답
-
![어린 자녀의 공격적 행동에 대처할 수 있는 부모의 관리 방안]()
어린 자녀의 공격적 행동에 대처할 수 있는 부모의 관리 방안
-
![아이 시공간 인식 능력 키운다…'비디오 게임' 장점 과학전 근거 나와]()
아이 시공간 인식 능력 키운다…'비디오 게임' 장점 과학전 근거 나와
-
![공격성 드러내는 자녀의 '외현적 문제행동', 어떻게 다루나]()
공격성 드러내는 자녀의 '외현적 문제행동', 어떻게 다루나
-
![자녀가 일으키는 행동 문제, 어떻게 대처하는 것이 좋을까?]()
자녀가 일으키는 행동 문제, 어떻게 대처하는 것이 좋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