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지막 이야기 "넌 괜찮니. 난 노력중이야"
보리의 하루는 늘 똑같다.
마치 어제의 일상을 데칼코마니로 찍어 낸 것처럼 밥 먹고 자고 싸고 또 자고, 집 주변을 뱅뱅 돌았다가 지쳐서 헥헥거리고, 물 먹고 간식 먹고 다시 자고. 일어나서 밥 먹고 또 자는.
![[고영리 작가의 Pet Story]나이듦이 흐르다 _ 늙어가는 개와 함께 하는 시간 4](http://img.famtimes.co.kr/resources/2015/10/05/XapIML5n3YjX0FBL.jpg)
그렇게 매일이 평범하게 흘러간다.
아마도 그 평범 속에서 보리는 조금씩 아주 조금씩 생명의 끈을 잘라내고 있으리라.
이렇게 평범 속에서 늙어가는 보리와는 달리 건강했던 지오에게는 이 원고를 쓰고 있는 오늘, 갑작스런 선고가 떨어졌다. 림프암.
올해 8살. 여전히 뛰는지 나는지 구분이 안 갈 정도로 활발하고 씩씩한 14키로 코카스파니엘.
내게는 아들이고 부모님께는 손주 같은 녀석이 오늘, 검진을 받으면서 림프암 판정을 받았다. 몇 가지 조직검사를 더 해야 확실한 100%에 대한 확진이 나오겠지만 지금으로서는 90% 이상이다.
건강하고 천방지축인 반려견 한 마리, 그리고 점점 늙어가는 노령견 한 마리와 살던 내 입장이 갑자기 길어야 1년이라는 시한부 선고를 받은 병든 개와 언제 무지개다리를 건너도 이상하지 않은 늙은 개와 사는 입장으로 바뀌어 버렸다.
어쩌면 보리를 보내고 몇 년 뒤에 지오를 보낼지도 모르겠다는 막연한 내 머릿속 생각은 두 녀석이 앞서거니 뒤서거니 내 곁은 떠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과 지오의 마지막이 내가 견딜 수 없을 정도로 괴로울지도 모른다는 암담함, 나보다는 늙은 부모님들이 받을 상실감에 대한 걱정으로 꽉 차버렸다.
여전히 씩씩하고 활발한 녀석을 보며 맘 한 구석이 찌릿하게 쑤셔오고, 8년 전 겨울, 안 데려가면 며칠 뒤 보신탕집에 넘길 거라는 말에 욱해서 지오를 안고 돌아온 그 날의 내가 원망스럽기도 했다. 아주 사소했던 것 까지 떠오르며 혹시 그게 원인이 아닐까, 이게 원인일까 자책하는 시간도 늘었다.
![[고영리 작가의 Pet Story]나이듦이 흐르다 _ 늙어가는 개와 함께 하는 시간 4](http://img.famtimes.co.kr/resources/2015/10/05/GuAmoth9k8rENOkN.jpg)
하지만 곰곰 생각해보면 언젠가는 올 일이었다.
그게 보리처럼 천천히 사그라들듯 올 수도 있고 지오처럼 갑작스레 올 수도 있는 것이었을 뿐, 삶의 마지막이라는 것은 누구에게나 공평한 것. 내 두 반려견에게 그 시간이 가까이 다가왔을 뿐 내가 피하고 싶다고 피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싫다고 외면할 수 있는 것도 아니었다.
언젠가는 부모님도 그렇게 마지막 시간을 맞이하실 테고, 나 역시 그럴 것이다.
세상 모든 생명에게 유일하게 공평한 것은 죽음뿐인데 그걸 선고 받았다고 해서 억울해 할 일은 아니었다.
그렇게 생각하니 오히려 고마웠다.
보리의 하루하루를 감사하게 지켜보고 있는 것처럼 지오에게 남은 시간을 더 넉넉한 사랑으로 채워줄 수 있으니까. 어떤 방법으로 두 친구들을 대해야 할 지 충분히 고민하고 결정할 수 있는 기회를 얻었으니 말이다.
오랜 가족회의 끝에 우리 식구는 지오의 항암치료는 하지 않기로 했다.
항암 치료를 통해 괴로워하는 사례를 너무 많이 본 까닭도 있었지만, 항암을 통해 완치 될 수 있는 병이 아니고 단지 현상 유지 혹은 생명 연장의 기능만을 한다는 사실을 들었기 때문이었다.
물론 항암을 택했을 경우 토하고 숨을 헐떡이며 누운 채 몇 개월을 더 살 수 있을지도 모르겠다. 하지만 뛰는 것보다 나는 것을 택하고, 걷는 일 없이 늘 겅중거리는 것을 즐기던 지오가 과연 그 삶을 만족해할까? 라는 논의 안에서 우리 식구는 모두 고개를 저었다.
지오는 동종요법을 통한 암 억제 외에 다른 조치는 하지 않을 것이다. 정말 힘들어지는 그 날까지 맛있는 거 먹고 신나게 놀고 맘껏 사랑받으며 지금처럼, 아무 일 없는 것처럼 살게 할 거다.
보리 역시 서서히 진행되는 노화를 막기 위해 무리스러운 조치를 하지 않는 것처럼 지오 역시 불편한 삶을 유지시키기 위한 내 욕심을 내려놓았다.
내가 꿈꾸는 내 마지막은 내 발로 걷고 내 손으로 밥 먹다가 조용히 자면서 죽는 것이다.
각종 장치를 주렁주렁 달고 생각만 살아 있는 채로 삶을 유지하고 싶지 않다.
그리고 나는, 내 사랑하는 반려견들 역시 그렇게 살다 가게 하고 싶다.
뒤에 남을 아픔과 혹 할지도 모를 후회는 사람인 내 몫이다.
나는, 내 몫으로 남을 그 감정들을 오롯이 견딜 것이고 대신 내 강아지들은 가는 날 까지 맛있게 먹고 신나게 놀았으면 좋겠다. 그리고 그걸 준비해주는 것이 주인으로서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이라 믿는다.
개 답게.
행복하게.
사랑 안에서 기쁘게.
그렇게 살다 무지개 다리를 씩씩하게 건너가게 해주고 싶다.
내 마지막 바람이다.
![[고영리 작가의 Pet Story]나이듦이 흐르다 _ 늙어가는 개와 함께 하는 시간 4](http://img.famtimes.co.kr/resources/2015/10/05/WcK3G6wFKeqSOiUO.jpg)
"그리고 지오"
이 원고를 써서 넘기고 한 달 후.
지오는 무지개 다리를 건너갔다.
하늘에 구름 한 점 없는 날이었고, 바람이 너무 시원한 그런 날 오전에 거짓말처럼 내 곁을 떠났다.
하루가 다르게 기운이 떨어져서 누워서도 헐떡이던 녀석이지만 꼭 화장실이 가고 싶으면 비틀거리며 배변판을 찾았고, 엄마는 그런 녀석을 보며 가슴을 쳤다.
"그냥 힘들면 누워서 싸도 괜찮아 지오야!"
그러면 녀석은, 암세포가 퍼져 순식간에 뿌옇게 멀어버린 눈을 힘겹게 들고 소리가 나는 쪽을 느리게 바라보았다.
"내가 이거 잘 하면, 엄마랑 대감님이랑 마님이랑 기뻐하잖아요."
꼭 그렇게 말하는 듯 했다. 그리고 낮게 흔드는 꼬리.
개라는 생물은 어쩌면 이렇게 죽는 순간까지도 충성스럽고 애잔한 것인지. 지오는 그렇게 하루가 다르게 사그라들었다.
떠나기 전날에는 고깃국 냄새만 맡고도 피를 토하고 싼 채 쓰러져 숨을 몰아쉬었고 떠나는 날에는 싸고 토할 힘조차 없어 숨만 힘겹게 내쉬었다.
그리고 떠났다.
내가 기도하고 바란대로 자는 듯 떠나준 것은 아니었지만, 좀 더 오래 살아 준 것도 아니었지만 지오는 이 세상에서 자신이 할 소임을 다 하고 훌훌 가벼이 떠났다.
한 줌 재라더니, 그 큰 녀석을 화장했는데도 재는 정말 한 줌이었다.
어찌나 뽀얗고 하얗던지.
녀석의 심성 같아서, 녀석의 성품 같아서 가슴이 미어져왔다.
소파 한 쪽에 앉아 있는 녀석이 없음에. 대문을 여는 소리보다 더 먼저 현관에 나와 반기는 녀석이 없음에. 누워 잘 때 발밑에서 따뜻하게 등 말고 기대오는 녀석이 없음에 순간순간 주체할 수 없게 눈물이 나오기는 한다. 그래도 가족들끼리 서로 얘기 나누며 이겨내는 중이다.
며칠 전에는 지오가 꿈에 나왔다.
꿈에서도 나는 지오가 이미 세상에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녀석이 너무 반가웠다. 침대 아래쪽에서 꼬리치며 달려오는 녀석이, 폭 안겨오는 감촉이, 몽실몽실 만져지는 몸통이 너무 생생해서 꿈에서도 얼마나 행복하고 고마웠는지 모른다.
지오는 그렇게 내게 안겨있다가 거실과 안방, 부엌을 차례대로 둘러보고 다시 사라졌다.
그 순간 꿈에서 깼고, 정말 지오가 떠났다는 생각에 새벽녘, 이불을 입에 물고 정말 많이 울었다.
솔직히 나는 요즘 보리를 보는 것도 아프다.
길 가다 코카스패니얼이 보이면 다리에 힘이 풀린다.
가슴이 찢어진다는 표현, 억장이 무너진다는 표현, 보고 싶어 죽을 거 같다는 표현.
이 모든 표현의 참 의미를 이번에 지오를 보내면서 비로소 알게 되었다.
지오는 훌훌 떠났고
나는 여기 있다.
그냥, 다른 거 다 필요 없고 딱 한 번만, 딱 한 번만 안을 수 있었으면 좋겠다.
딱.
한 번만.
![[고영리 작가의 Pet Story]나이듦이 흐르다 _ 늙어가는 개와 함께 하는 시간 4](http://img.famtimes.co.kr/resources/2015/10/05/35vM5FAxQt7vuW57.jpg)
애견신문 최주연 기자 4betterworld@naver.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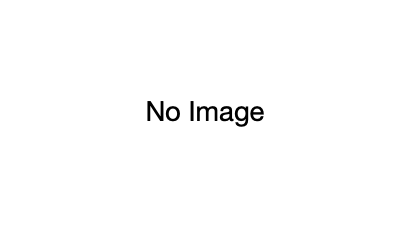


![[국내 여름 휴가지 추천] 동해 마음껏 볼 수 있는 강원도 여행! 속초 가볼 만한 곳·맛집·펜션은?](https://img.famtimes.co.kr/resources/2019/07/16/gZxYG6dABEiWmzvM.jpg)
![[국내 여름 휴가지 추천] 푸른 동해가 펼쳐진 '포항'...포항 가볼 만한 곳·맛집·펜션 총정리](https://img.famtimes.co.kr/resources/2019/07/08/aOGQxBoFCR7JmIbn.jpg)